[мұ…] л°•мҷ„м„ң, Flannery O'Connor
지난 주에 웹툰 감상을 하는 아침 5분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잠에서 덜 깨어 눈을 비비면 시신경이 잡아내는 해상도가 480i에서 4K로 이동하고 정보를 전달받은 뇌 조차도 방금 채널이 바뀌는 바람에 놓친 꿈의 어렴풋한 줄거리를 폰에 보이는 웹툰 장면을 보면서 더듬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루는 무협 폭력물 속에서 대충 누군가의 팔 다리를 아작내거나 '로어 올림푸스' 속 페르세포네의 발그레한 볼따구니를 보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누워서 한 손으로 볼 수 있는 킨들 페이퍼화이트를 봅니다. 한글책을 잔뜩 넣어뒀습니다. 박완서님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를 시작했다가 놓을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박완서님의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는 국딩의 눈에 만만하게 비치는 제목 때문에 국민학교 6학년 때(79년도쯤?) 읽었었죠. 꼴찌가 받는 갈채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어린이, 청소년기에 대중소설, 문학작품 가리지 않고 읽어댔었습니다. '그 많던 싱아~'는 지금 처음 읽습니다. 코웃음치며 90년대 초반 당시 인기를 무시하고 읽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일찍 이광수 등으로 시작해 어둠의 자식들, 인간시장 등까지 마구잡이로 읽다가 성인이 되기도 전에 한국 소설에 대한 폄하의 시각을 갖게 되었었죠. 이를테면 강석경의 '숲속의 방'에서 '광장'을 찾으려 애쓰기도 하는 등 80, 90년대를 지나며 그 시대 현실과 문학적 성찰의 궤가 갈라져 점점 동떨어지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보니 생각이 정리된 것이지 당시는 단순하게 끌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년전 문학계의 미투가 결론이 났는지 모르겠으나 제게는 축구협회에 대한 실망과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 지나 초로에 들어 노모를 모시는 입장에서 보는 박완서님의 자전적 소설, '그 많던 싱아~',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엄마의 말뚝1,2,3'은 가슴에 와 닿는 책입니다. 이 세 소설만 읽어도 박완서님의 자서전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많은 장편들도 그의 삶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 볼 수 있는 박완서님 인생의 스냅샷들이란 느낌입니다. 박완서님께는 외람되지만 마치 잘 씌여진 프차 정성글 같은 친근감이 그의 글에 들어있습니다.
박완서님의 책에 사로잡히게 된 이유는 기억의 동질성 때문이 아닙니다. 외국 생활을 10년 이상 하다 보니 구사하는 언어 중추가 잡종 성격을 띠게 되었습니다. 소리내는 한국어는 빨라지고 발음은 굴러가고 있습니다. 글을 쓰는 버릇 또한 단어 구사의 애매함이 자주 불거져서 할 수 없이 영어단어를 음차해서 쓰는 보그체가 되기 일쑤입니다. 그런 '스타일'이 돼버렸습니다. 프차에 글을 쓰면서 글버릇을 좋게 가지다가도 마음이 앞서는 날은 에라 모르겠다하고 영어단어를 섞어쓰게 되더군요. 박완서님의 영어의 흔적이 없는 글을 보니 어떤 해방감 비슷한 느낌이 왔습니다. 불편한 점은 내용의 시대적 배경 때문에 할 수 없이 등장하는 일본의 흔적을 읽어야 하는 것이지만 영어에 쩌들은 일상으로부터의 해방감을 느끼며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들수 있으니 역사 속 일본어의 흔적 정도는 감수할 만 합니다. 아마도 소설 전집을 마치고도 목마름이 남으면 박완서님의 수필집도 읽을 것 같습니다.
주로 붙잡는 것은 킨들 오아시스입니다. 침대에 누워 오아시스를 들고 보다가 자꾸 얼굴로 떨어뜨리게 되어 오아시스에는 영어책만 넣어놓고 앉아서만 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게시판에서 소개받은 앤드류 포터의 단편집 중 맨 첫 소설 ' The Hole'을 읽었습니다. 너무 잘 써서 욕이 나왔다는 회원분의 소감을 먼저 들었기에 호감도 있었고 내용도 좋았습니다. 이의를 제기하자면 잘 빠진 '상품' 같았습니다. 반짝반짝 광을 내어 흠 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제가 흠을 잡는다면 단 한 가지, 영어 문장 '투'입니다. 작가들마다 문장의 스타일이 있는데 데뷰작인 만큼 세련됐지만 작가 자신만의 모습은 아직 미숙한 아직 제대로 뜨지 않은 막걸리 맛 같습니다. 표지에 있는 작가의 이름을 잊으면 작품으로부터 유추하려는 작가의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레이몬드 카버의 문장보다는 덜 단순하지만, 내용의 흐름을 보면 레이몬드 카버가 씬 하나를 극사실적으로 묘사한데 비해 앤드류 포터는 영화감독의 입장에서 편집 작업할 필요 없이 잘 손질한 여러 씬을 나열했습니다. 비디오 세대에게 더욱 친숙한 글 쓰기라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저 읽고 나면 재미여부와 상관없이 이 작가의 문장 '투'에 대해서 곱씹어 볼 것입니다.
번역판 앤드류 포터의 단편집 표지에는 '플래너리 오코너상 수상' 배지가 붙어 있습니다. 좋은 한국 작품들이 누구나 아는 '이상'문학상을 받듯이 누군가의 이름으로 상이 있다면 일단 그 이름 주인공의 작품을 먼저 봐야겠죠. 마침 플래너리 오코너의 단편집이 도서관에 신청한 지 거의 6개월이 넘어서야 차례가 왔습니다. Goodreads 사이트의 평도 너무 좋고 한국에는 2015년경 번역판에 대한 많은 분들의 호평이 인터넷 여기저기에 있더군요. 한국 번역판을 읽어도 좋을 오코너의 작품 리뷰에 지금 쓰게 될 저와 같은 감상을 느낀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소개할 영어 원문이나 번역문이나 내용은 같지만 너무도 익숙한 묘사이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플래너리 오코너 단편집에 첫 번째 수록 작품인 'The Geranium'을 읽다가 마주친 이 한 문단 때문에 앤드류 포터까지 끌어들여 말을 꺼냈습니다. 1946년에 출판된 이 단편에서 오코너는 뉴욕의 지하철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2021년 지금 읽어도 현대적인 묘사입니다. 현대의 우리가 읽기에는 너무도 평범한 우리들의 매일매일 '경험'과 일치하는 문구이기에 지금까지 지하철이 등장하는 많은 글들에 비슷하게 묘사되었고 읽었을 법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은 1946년 미국에서 씌여진 오코너의 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상'의 문학을 걸고 상을 주듯 '플래너리 오코너' 이름으로 상을 줄 만 합니다.
그들은 "지하철"을 탔다- 땅 아래에 있는 커다란 동굴 같은 철길이다. 끓어넘치듯 기차에서 나온 사람들이 거리로 향한 계단을 올라갔다. 거리에서 구르듯 내려온 사람들은 기차에 올라탔다.- 흑인, 백인, 황인종이 수프 속의 야채처럼 골고루 섞여 있었다. 모두가 들끓는 듯 했다. 터널에서 기차가 플랫폼 끝까지 밀려 들어오더니 갑자기 멈췄다. 사람들은 마주 오는 사람들을 밀어내듯 밖으로 뚫고 나왔고 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자 기차는 다시 홱 가버렸다.
(구글 번역 신뢰도 20% 이하입니다. 특히 전치사에 의한 문장묘사가 아예 번역이 반대로 되는군요. 문장 일부를 송두리째 빼먹기도 하네요. 제가 좀 많이 고쳐야 했고 canal은 현대에 맞게 플랫폼으로 바꿨습니다)
They went in a "subway" - a railroad underneath the ground like a big cave. People boild out of trains and up steps and over into the streets. They rolled off the street and down steps and into trains - black and white and yellow all mixed up like vegetables in soup. Everything was boiling. The trains swished in from tunnels, up canals, and all of a sudden stopped. The people coming out pushed through the people coming in and a noise rang and the train swooped off again.
- Krishnamurti
| кёҖм“°к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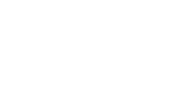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
근데 문장중에 킨들 페이퍼화이트에 한글책 넣었다는 대목이 있는데
저도 킨들화이트페이트 직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책만 보는게 답답한데 한글책 어떻게 넣어 보나요
제가 가진책들 다 스캔해서 한글pdf로 만든게 백권 정도 있는데 이것 킨들에 넣고 싶습니다.